과학서평 / 바람의 자연사
바람 하면 선거를 치루는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기를 바랄 것이다. 배우자에게 불안한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몰려올까 걱정할지 모른다.여기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과학적인 행적을 정말 탁월하게 그린 책이 있다. ‘바람의 자연사, 그리고 곧 바람 소리가 들렸다’이다. (AND SOON I HEARD A ROARING WIND, A Natural History of Moving Air).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들, 바람의 길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탐험하기 위해 저자인 빌 스트리버(Bill Streever 1961~)는 책을 통해 읽은 지식에 만족하지 않았다. 3일 짜리 항해 교육을 받은 뒤 아내와 함께 50년된 낡은 돛배 로시난테 호를 타고 텍사스에서 과테말라까지 43일 동안 1,6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했다. 로시난테는 돈키호테의 말 이름이다.
굳이 돛단배를 선택한 것은 바람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람의 크기를 돛단배를 통해서 처음 기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측정 가능한 과학의 영역으로 조금씩 옮겨놓은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로 스트리버는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Lewis Fry Richardson 1881~1953)을 꼽는다. 과학자이자 평화주의자인 리처드슨은 날씨를 계산한 최초의 인물이다.
과학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리처드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쉽게 떠오르는 인물은 아니다. 날씨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최근에 자리를 잡은 것을 생각하면, 리처드슨이 공헌한 내용은 확실히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 전통분야에 비해서는 무명에 가깝다.
일기예보가 20세기 들어서야 자리를 잡고, 기상 전선(front)이라는 말은 1차 대전을 앞두고 형성된 여러 나라의 힘의 대치상황인 전선(front)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 등장했다. 날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바람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오래동안 숨겨져 왔다. 그저 바람은 천지조화요, 신의 뜻으로만 생각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거나 기우제를 드렸을 뿐임을 생각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무모하게 보였을까 짐작하게 한다.
노르웨이인 예보에 맞춰 상륙날짜 정해
바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과학적 방법이 옳다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으로 저자는 2차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꼽는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D데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날씨였다. 20만 명의 병력, 1만1,000대의 항공기, 7,000척의 배가 움직일 때 과연 어느 날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려야했다.
공습을 위해서는 달빛이 필요하고, 상륙정을 위해서는 간조가 필요하고, 바람이 많이 불지 말아야 했다. 달빛과 간조의 조건이 충족되는 날짜는 6월 5,6,7일이었지만, 바람은 알 수 없었다.
당시 노르웨이인과 미국인 일기예보관은 1주일에 걸친 미래 날씨를 예측했는데 1944년에는 1주일 뒤 날씨 예측이 엄청나게 긴 불확실한 장기예측이었다. 노르웨이 예보관은 수학 및 물리에 현실적인 측면을 결합한 베르겐 학파의 방식을 따랐지만, 미국 예보관은 과학적 기반이 미미한 경험에 의존했다. 미국 예보관은 50년간의 날씨 기록을 토대로 여름철에 대서양 동부에 형성되는 고기압이 영국해협을 보호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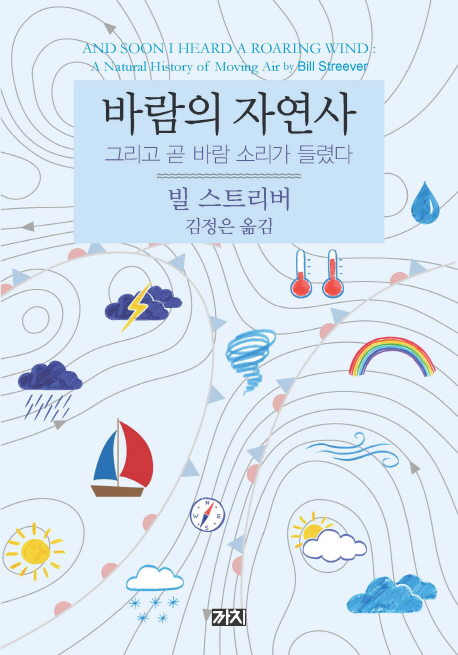
1944년 6월 5일을 둘러싸고 미국 예보관은 평온한 날씨를 주장했지만, 노르웨이 예보관은 강한 바람을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바람소리가 거세지면서 노르웨이 예보관의 예측이 맞았다. 노르웨이 예보관은 빌헬름 비에르크네스(Vilhelm Bjerknes 1862~1951), 그의 아들 야콥 비에르크네스(Jacob Aall Bonnevie Bjerknes 1897~1975)와 베르겐 학파의 방식을 가지고 예측해서, 이튿날 짧은 소강상태가 나타나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영국 해협 건너 독일군은 강한 바람이 계속 불 것을 예상하고 경계태세를 늦췄으며, 에르빈 로멜 독일 원수는 아내에게 줄 신발 선물을 주려고 병영을 떠났다.
아이젠하워는 바람이 잠시 잠잠해질 것으로 예측된 그 시간,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1919년 저기압의 전선 모델을 만든 그 비에르크네스가 확립한 현대 기상예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만들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바람을 이용한 화공(火攻)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듯이, 바람은 인간의 생사화복에서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로 여겨졌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긴 세월이 걸렸다. 저기압 고기압 전선이 만나면 하늘에서 긴장감 넘치는 바람의 대치상태가 이어지면서 밀고 밀리는 대치상태가 이어지다가 급기야는 덥거나 춥거나 혹은 수만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통제불능의 재난이 생긴다.
이렇게 중요한 바람의 움직임을 인간은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파악하기 시작했으니, 바람의 흔적을 잡으려는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나게 한다.
방송에서 일기예보라는 것이 등장하기는 미국의 경우 1940년이다. 방송국은 날씨예보의 시간을 시청자들에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그리고 ‘고기압-저기업’ 체계를 설명하는 기상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했다.
지금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먼저 검색하는 정보가 날씨이다. 그리고 그 날씨예보가 엄청나게 정확하다. 하루 정보로는 부족해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본다.
날씨예보가 집단 폭력 예측에 도움을 줄까
1934년 미국 그레이트 플레인스에 불어 닥친 광풍으로 약 7,00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1988년 휴양도시로 유명한 멕시코 칸쿤에 가장 강력한 5등급의 허리케인이 몰려와 시속 350㎞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정확한 예보에 따라 휴양객과 주민들이 빠져나갔다. 목숨을 걸고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남았거나, 새우잡이 배를 지키려고 남았던 선원 등 적은 숫자의 사망자만 발생했을 뿐이다.
바람의 성격을 파악하면, 인간의 집단 폭력도 예측하는 예지력이 생기는 것 같다. 1935년 리처드슨은 ‘1차 상미분방정식’이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1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는 수학을 과학저널 ‘네이처’ (Nature)에 소개했다. 그는 계속 폭력에 수학을 적용해서 1939년 ‘일반화된 대외정치’(Generalized Foreign Politics) 1949년에 ‘무기와 불안감’ (Arms and Insecurity), 1950년에 ‘사투의 통계학’(Statistics of Deadly Quarrels)을 발표했다.
날씨예보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꽤 좋은 경제효과를 내는 기상산업으로 발전했다. 앞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산업으로 안내할 것 같다.
< 이 기사는 사이언스타임즈(www.science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데일리비즈온은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송고를 허용합니다.>

